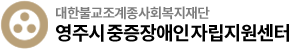자립생활 전후 확 바뀐 발달장애인의 삶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9.11.22 조회12,406회 댓글0건본문
▲ 지난 20일 서울 대학로 유리빌딩 대강의실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시설화 위기 방지와 지역사회에서의 삶 만들기' 토론회에서 발달장애인 탈시설 당사자 상남 씨가 발언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토론회에서 웃고 울린 당사자의 생생한 증언
“갇혀 있는 건 답답”…“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시설에서 나와 자립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좌중을 울리고 웃겼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5개 장애인권단체 주최로 지난 20일 서울 대학로 유리빌딩 대강의실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시설화 위기 방지와 지역사회에서의 삶 만들기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설 발달장애인 상남·경남·기정·의용 등 4명의 어린 시절, 시설에서 겪었던 일들, 자립하게 된 계기, 현재 살아가는 모습 등을 소개하는 증언대회가 진행됐다. 이중 직접 상남 씨와 의용 씨의 증언을 정리했다.
상남 씨는 태어나면서부터 시설에서만 살았다. 시설에서는 선생님들이 때리고, 욕하고, 못살게 굴었다고 한다. 그런 시설 생활을 견디지 못해 말을 안 듣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아이들과 싸우며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한다.
이후 대전 유성초등학교와 유성여자중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에 가지 않고 다시 대전의 모 시설로 옮겨갔다. 그곳에서 비닐하우스에 농작물을 심거나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1년에 8만 원에서 18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급여를 받았다.
“다른 애들은 2~3천만 원 줬었어. 그런데 나는 부모가 없었잖아. 그래서 나만 봉사활동 한 거야.”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해당 시설에서는 상남 씨를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멋대로 진단한 뒤 강제로 한 노인요양병원에 입원시켰다. 병원에서 상남 씨는 하루 종일 침대에 묶여 있었다. 걷는 법을 잊어버릴 정도로.
“화장실을 걸어서 가본 적이 없어. 언제부터인가 혼자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됐어. 가끔 걸으면 다리가 무겁고 허리가 아팠어. 근육이 약해져서 한동안 휠체어를 타야 했어.”
상남 씨는 장애인권활동가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병원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세상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2014년 4월, 침대에서 벗어나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왔다. 병원 문을 나서자 예쁜 산책길이 있었고, 멋진 호수가 펼쳐져 있었다.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였지만, 요양병원에 수용된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세상이었다.
요양병원을 나와 다른 여러 병원으로 옮겨 다니며 살았다. 오래 묶여 있었던 탓에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전 건양대학교병원으로 외래진료를 다녔다. 그곳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아니다’라는 재진단을 받을 수 있었고, ‘걷는 연습을 해야 휠체어를 계속 타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됐다.
상남 씨는 걷는 연습을 시작했다. 통장도 새로 만들었다. 그리고 활동가들에게 전화를 걸어 “나 좀 데려가라”라고 호소했다. 자립생활의 의지를 갖게 된 것이다. 활동가들은 상남 씨가 살 곳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상남 씨의 장애에 대해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러다 서울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립생활주택 ‘세림아파트’에서 입소 동의가 떨어졌다. 이곳에 입주해 상남 씨는 드디어 자립생활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다.
“요즘 기분이 좋아. 앞으로 여기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 같이 시설을 나왔던 친구들하고 여기서 살고 싶어. 나와서 사니까 평화로워. 마음이 편해지고, 꼭 내 집같이 생각하게 돼. 여기서 먹고 놀고, 학교도 다니면서 지내. 그냥 잘 지내.”
의용 씨의 기억은 흐릿하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거의 없다. 그저 어머니를 오래전 여의었다는 것, 불광동에서 아버지와 살았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마저 돌아가셨다는 것이 전부다.
“아버지는 암으로(정확하지 않음) 돌아가셨어요. 그 뒤에 안산에서 사촌 누나와 같이 살게 됐어요. 그런데 사촌 누나 밑에서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곳에서 계속 살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전달하기는 어려운 듯, 의용 씨는 말끝을 흐렸다. 오래 가지 않아 의용 씨는 사촌 누나의 집을 나왔다. 지금은 기억할 수 없는 어딘가에서 일을 해 약간의 돈을 벌었다. 그 때문에 수급비가 환수된 것은 전혀 몰랐다. 어떻게든 돈이 있을 때는 찜질방에서 자고, 없을 때는 문이 열려 있는 중고차를 찾아 들어가 잤다.
그러다 의용 씨는 지하철을 타고 어린 시절 살았던 곳, 서울 은평구로 무작정 넘어왔다. 그렇게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고 한다. 그런 의용 씨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의용 씨가 오래 전 다니던 교회의 한 장애인부서 교사가 발견했다. 교사는 그대로 의용 씨를 데리고 교회로 들어왔다. 그 짧은 만남이 의용 씨의 삶을 바꿔놓았다.
이날 의용 씨의 공공후견인으로 함께 자리한 담당 교회 목사는 당시 처음 본 의용 씨의 모습을 ‘정말 누추했다’고 회고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짐작할 수도 없었어요. 그 뒤로 교회 선생님들이 많이 도왔죠. 의용 씨가 자립해 고시원에 살 수 있도록 다들 힘을 보탰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의용 씨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 자립생활을 하고 있다. 사회자가 의용 씨에게 “목사님이 힘들게 하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라”는 짓궂은 질문을 던지며 담당 목사의 귀를 막았지만, 의용 씨는 한 마디도 나쁜 말을 하지 않았다. 좌중은 웃음바다가 됐다.
의용 씨는 고시원에서 살면서 돈을 조금 모아 지금은 역촌동사무소 뒤 원룸에서 살고 있다. 청소하는 게 어렵고, 빨래와 설거지를 하는 게 힘들지만 의용 씨에게는 교회가 있다. 교회에 가면 친구들이 있고, 의용 씨가 좋아하는 탁구대도 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한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햄버거”라고 밝힌 의용 씨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아파트에 사는 것이 꿈”이라며 웃었다. 비장애인들과 다르지 않은 꿈이었다.
정지원 기자 (kaf29@ablenews.co.kr)
출처: 에이블 뉴스 (2019-11-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