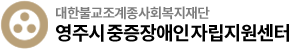미국 장애인 돌봄, 사회서비스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25.04.29 조회4,173회 댓글0건본문
【에이블뉴스 이정주 칼럼니스트】 미국의 장애인 돌봄은 보편적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유럽 국가와 달리 잔여적이며 선별주의 방식을 취하며,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복지와 돌봄 서비스 영역을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풀어왔는데 최근에는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특히 2022년 3.5조 메가법안(3.5 trillion mega bill)를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미국 GDP 중 35%를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비전 가운데 ‘돌봄의 시장화’,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장애인복지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장애판정(SSD) 및 소득 지원 프로그램인 장애연금(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 또는 기초수당(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을 신청하는 과정을 보면 민간시장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며 많은 비용이 뒤따른다.
이를 두고 ‘미국에서는 돈 없으면 복지서비스도 제대로 받을 수도 없는 나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장애판정을 받기 위해 많은 절차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의미다. 먼저 의학적 근거(Medical record)로 입증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자산(Means)을 입증해야 한다. 둘 모두 개인의 경제 능력에 따라 유불리가 작동한다. 장애판정을 위해 CT, MRI 등 각종 값비싼 입증자료는 크게 도움이 된다. 자산(Means)도 마찬가지이다. 경제활동 경력은 많을수록 좋고, 경제상태는 좋지 않을수록 좋다.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컨설팅도 받고, 장애판정 가이드북을 구매하기도 한다. 가이드북은 권당 200달러 또는 350달러나 한다. 만약 최초 장애판정을 받지 못하면 재심 청구가 가능한데 이때부터는 오로지 변호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인지 미국 각 주의 사회보장청(SSA) 인근에는 Disability 전문변호사 사무실이 즐비하다. 장애판정 이후에도 주로 민간 NGO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구조이다 보니 복지서비스와 민간시장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사회서비스 시장으로 전환은 다분히 미국식 돌봄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로 보여진다.
특히 장애인고용과 돌봄에 필요한 인력의 다변화, 다양화는 사회서비스 시장 도래의 마중물이자 기폭제로 보인다. 이미 장애인고용은 지원고용, 잡코치 등의 근로지원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메디케이드(Medicaid)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도 늘려왔다.
최근 ‘가정 및 지역 기반 서비스제도(HCBS,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Program)’를 근거로 지역사회 돌봄이 강화되면서 이분야 사회서비스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종래의 ‘활동 보조 서비스(PAS, Personal Assistant Service Program)’, ‘케어 서비스(PCA, Personal Care Assistant Service)’, 그리고 ‘지역사회 자립지원 서비스(MFP, Money Follows the Person)’를 넘어서 미국 내 각 주별로 장애인 돌봄 사회서비스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중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케어 도우미’와 ‘합법적 무자격간호사 파견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케어도우미는 주 정부 메디케이드 담당부서에 소속된 전문적인(등록된) 간호사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지체장애인, 정신적 장애인과 기타 일상생활에서 활동보조가 필요한 사람에게 활동보조서비스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 인력이다. 주로 노인이나 장애인이 거주하는 병원, 요양원, 시설, 가정 등에서 배치된다.
케어도우미는 양성과정을 이수하지만 전문적인 자격증과 면허가 부여되는 전문가 수준은 아니고 단순한 응급처치만 가능하다. 국제노동기구의 직업 및 산업 분류에 따르면 케어도우미는 보건서비스 인력으로 분류되며, 무자격 보조인(Unlicensed assistive personnel), 간호도우미(nursing assistant), 케어도우미(care assistant), 가정간호도우미(home health aide), 간호보조원(nurse aide), 케어기술자(care technician) 등으로 불린다. 영국과 캐나다 등지에서도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합법적 무자격간호사 파견사업(Nurse Delegation Program)’은 케어도우미 보다는 다소 앞선 의료적 처치를 취할 수 있는 인력이다. 비록 간호사 자격은 없지만 준간호인력으로 양성된 인력으로서 약간의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파견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뉴저지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재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좌약이나 복약 관리, 기침가래 관리, 카테터 사용 및 관리, 관장, 인공항문 관리, 배뇨관리, 창상 치료, 욕창 관리 등의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기존 활동보조인으로는 할 수 없었던 와상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로, 불법으로 활동보조인에게 의료적 서비스를 받거나 방치될 수 있는 돌봄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케어서비스 주요대상자는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이며 메디케이드 수급자만 해당된다.
사실 이러한 고난이도의 장애인 돌봄서비스 프로그램은 이미 복지국가를 표방했던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실천했던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어찌 보면 미국은 뒤늦게 시작한 것이다. 마치 우리나라가 장애인고용(Disability Empoyment)이라는 개념을 늦게 받아들였지만 장애인정책의 한 획을 그어온 과정과 유사하다.
잠깐 장애인고용이라는 개념이 유래를 짚어보자면, 1983년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명명됐고, 그 주장의 요체는 신자유주의 도래와 맥이 닿아있다. 장애인고용정책은 과도한 복지비용을 타개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고,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정부가 제공하는 연금과 수당의 증가 추세를 진정시킬 목적이었다.
실제로 경제적 효과가 적지 않았다. 반면 유사한 용어로 알고 있는 직업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의 출발은 정반대 지점이었다. 인간에게 직업이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고의 가치적 도구로 보았다. 출발점이 완연히 다른 두 개념은 한국에 들어와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라는 학제적 융합을 이뤘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한국식 장애인고용정책은 많은 후발 국가들이 배우고 싶은 사회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듯이 지금 미국의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는 장애인의 인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저성장 시대 GDP 성장의 수단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나 장애인을 위해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무슨 방식이라도 장애인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양과 질이 늘어날 수만 있다면 돌봄의 시장화, 사회서비스 시장화 역시 장애인 돌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구사하는 지구상 최고 최대의 국가, 미국이 추구하는 돌봄의 시장화, 사회서비스 시장의 확대는 비록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많은 국가의 그 국민에게 경시될 수 있으나 새로운 복지의 미래는 미국이 선택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특히 2022년 3.5조 메가법안(3.5 trillion mega bill)를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미국 GDP 중 35%를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비전 가운데 ‘돌봄의 시장화’,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장애인복지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장애판정(SSD) 및 소득 지원 프로그램인 장애연금(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 또는 기초수당(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을 신청하는 과정을 보면 민간시장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며 많은 비용이 뒤따른다.
이를 두고 ‘미국에서는 돈 없으면 복지서비스도 제대로 받을 수도 없는 나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장애판정을 받기 위해 많은 절차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의미다. 먼저 의학적 근거(Medical record)로 입증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자산(Means)을 입증해야 한다. 둘 모두 개인의 경제 능력에 따라 유불리가 작동한다. 장애판정을 위해 CT, MRI 등 각종 값비싼 입증자료는 크게 도움이 된다. 자산(Means)도 마찬가지이다. 경제활동 경력은 많을수록 좋고, 경제상태는 좋지 않을수록 좋다.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컨설팅도 받고, 장애판정 가이드북을 구매하기도 한다. 가이드북은 권당 200달러 또는 350달러나 한다. 만약 최초 장애판정을 받지 못하면 재심 청구가 가능한데 이때부터는 오로지 변호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인지 미국 각 주의 사회보장청(SSA) 인근에는 Disability 전문변호사 사무실이 즐비하다. 장애판정 이후에도 주로 민간 NGO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구조이다 보니 복지서비스와 민간시장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사회서비스 시장으로 전환은 다분히 미국식 돌봄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로 보여진다.
특히 장애인고용과 돌봄에 필요한 인력의 다변화, 다양화는 사회서비스 시장 도래의 마중물이자 기폭제로 보인다. 이미 장애인고용은 지원고용, 잡코치 등의 근로지원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메디케이드(Medicaid)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도 늘려왔다.
최근 ‘가정 및 지역 기반 서비스제도(HCBS,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Program)’를 근거로 지역사회 돌봄이 강화되면서 이분야 사회서비스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종래의 ‘활동 보조 서비스(PAS, Personal Assistant Service Program)’, ‘케어 서비스(PCA, Personal Care Assistant Service)’, 그리고 ‘지역사회 자립지원 서비스(MFP, Money Follows the Person)’를 넘어서 미국 내 각 주별로 장애인 돌봄 사회서비스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중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케어 도우미’와 ‘합법적 무자격간호사 파견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케어도우미는 주 정부 메디케이드 담당부서에 소속된 전문적인(등록된) 간호사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지체장애인, 정신적 장애인과 기타 일상생활에서 활동보조가 필요한 사람에게 활동보조서비스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 인력이다. 주로 노인이나 장애인이 거주하는 병원, 요양원, 시설, 가정 등에서 배치된다.
케어도우미는 양성과정을 이수하지만 전문적인 자격증과 면허가 부여되는 전문가 수준은 아니고 단순한 응급처치만 가능하다. 국제노동기구의 직업 및 산업 분류에 따르면 케어도우미는 보건서비스 인력으로 분류되며, 무자격 보조인(Unlicensed assistive personnel), 간호도우미(nursing assistant), 케어도우미(care assistant), 가정간호도우미(home health aide), 간호보조원(nurse aide), 케어기술자(care technician) 등으로 불린다. 영국과 캐나다 등지에서도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합법적 무자격간호사 파견사업(Nurse Delegation Program)’은 케어도우미 보다는 다소 앞선 의료적 처치를 취할 수 있는 인력이다. 비록 간호사 자격은 없지만 준간호인력으로 양성된 인력으로서 약간의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파견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뉴저지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재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좌약이나 복약 관리, 기침가래 관리, 카테터 사용 및 관리, 관장, 인공항문 관리, 배뇨관리, 창상 치료, 욕창 관리 등의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기존 활동보조인으로는 할 수 없었던 와상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로, 불법으로 활동보조인에게 의료적 서비스를 받거나 방치될 수 있는 돌봄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케어서비스 주요대상자는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이며 메디케이드 수급자만 해당된다.
사실 이러한 고난이도의 장애인 돌봄서비스 프로그램은 이미 복지국가를 표방했던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실천했던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어찌 보면 미국은 뒤늦게 시작한 것이다. 마치 우리나라가 장애인고용(Disability Empoyment)이라는 개념을 늦게 받아들였지만 장애인정책의 한 획을 그어온 과정과 유사하다.
잠깐 장애인고용이라는 개념이 유래를 짚어보자면, 1983년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명명됐고, 그 주장의 요체는 신자유주의 도래와 맥이 닿아있다. 장애인고용정책은 과도한 복지비용을 타개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고,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정부가 제공하는 연금과 수당의 증가 추세를 진정시킬 목적이었다.
실제로 경제적 효과가 적지 않았다. 반면 유사한 용어로 알고 있는 직업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의 출발은 정반대 지점이었다. 인간에게 직업이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고의 가치적 도구로 보았다. 출발점이 완연히 다른 두 개념은 한국에 들어와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라는 학제적 융합을 이뤘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한국식 장애인고용정책은 많은 후발 국가들이 배우고 싶은 사회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듯이 지금 미국의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는 장애인의 인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저성장 시대 GDP 성장의 수단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나 장애인을 위해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무슨 방식이라도 장애인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양과 질이 늘어날 수만 있다면 돌봄의 시장화, 사회서비스 시장화 역시 장애인 돌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구사하는 지구상 최고 최대의 국가, 미국이 추구하는 돌봄의 시장화, 사회서비스 시장의 확대는 비록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많은 국가의 그 국민에게 경시될 수 있으나 새로운 복지의 미래는 미국이 선택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